[송호근의 세사필담] 죽음에 이르는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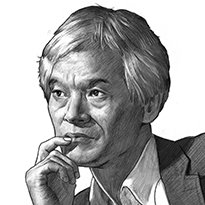
민주주의 37년째를 보내는 경제 대국, 성탄절 이브 발걸음은 무겁다. 마음에 통행금지 빗장이 걸렸다. 먼 미래는커녕 가까운 미래조차 가늠할 수 없다. 그 시대착오적 비상계엄령이 연말의 훈훈한 기운을 몰아냈고, 이때를 놓칠세라 득의만만한 거야(巨野)의 독오른 공세에 마음의 행로는 차단됐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절규는 처절한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을 고하는 중이다. 이미 토막 난 한국 정치, 봉합 불가다.

민주주의를 죽이는 최악의 질병이 ‘극단적 양극화’다. 이 질병은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탄생하면서 예고됐다. 정치권에 대거 진입한 586세대가 미래를 열어줄 것으로 믿었다. 이른바 ‘혁명세대’는 보수정치인들을 독재 하수인으로 낙인찍었고, 검찰·경찰·국정원 등 사찰기관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했다.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진입하면서 이념 전쟁에 불을 댕겼다. 정적(政敵)을 음해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은 여야 가릴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최상의 표적이었다. 모두 감옥에 갔거나 수사 대상이 됐다. 정치 경쟁자를 겨냥한 이토록 잔인한 공격은 남미에서나 보는 풍경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20년간 깊어져 한국 민주주의는 마침내 ‘죽었다’.
희망이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야당의 포화에 막혀 되는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계엄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쓸 줄이야. 국회발 내란죄 혐의와 탄핵소추 앞에 국가기능은 마비됐다. 이 총체적 난국에 지휘권을 별안간 넘겨받은 야당 대표는 점령군처럼 의기양양한데, 참사의 근본 원인인 정치 양극화의 책임은 가려졌다.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끊은 대통령의 빈자리를 민주당 리더가 채운들 민주주의가 되살아날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광란의 춤’, ‘반국가세력’이라 지칭해 민주주의 룰을 망가뜨린 것처럼, 반민주·반민생·반민족 팻말로 내내 항거한 야당의 행보도 다를 바 없다. 양자 모두 민주주의 울타리를 부수고 뛰쳐나갔다. 탄핵 국회에서 민주주의 룰을 지키라는 국회의장의 호소는 그럴듯하게 들렸으나 그릇을 깬 것은 피차 마찬가지였다.
민주주의의 사망진단서를 쓴 레비츠키와 지블렛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극단적 양극화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대중선동가들의 출현을 방조하기 때문이다. 유력 정치인들이 상대 당의 맹공을 받아 끌어내려지면 바로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아웃사이더들이 등장한다. 정당정치의 초보자들이 들어선다. 국민의힘이 정권 유지를 위해 전직 검찰총장을 급히 영입했듯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야당 대표 역시 정당정치 경륜이 없는 포퓰리즘 아웃사이더다. 독재성향을 감춘 아웃사이더를 걸러내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정당의 책무라면, 여야 정당은 앞장서서 가장 중대한 책무를 버렸다. 민주당 586 세대원들이 팬덤 정치의 총아를 내세워 정권 재탈환에 나선 것은 예정된 코스였다. 민주 열망에 가득찬 시민들이 쌍심지를 켜고 있어도 이런 탈선 정당들이 활개를 치는 한 민주주의는 회생불가다.

민생과 민의(民意)? 윤석열과 국힘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는데 민주당도 민생과 민의를 진정 고뇌했다면, 탄핵 남발, 임명 거부, 예산 삭감, 외교 비방을 주야장천 감행했을까. 여당이 붕괴한 탄핵 시국에 야당은 국가 존망과 안위를 우려하기보다 여전히 유사포퓰리즘 입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게 국가안전보다 시급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양곡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국회증언감정법 등등. 이런 입법안이 세금 낭비, 도덕적 해이, 기업인 군기 잡기 같은 부작용을 품고 있는지 검증조차 안 됐다. 문재인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와 최저임금제가 초래한 심각한 부작용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탄핵 경고를 받았다.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침몰시킬 가장 화력이 센 최종병기다.
정당이 독선에 능한 정치인을 걸러낸 것은 DJ정권까지다. 이후 정당들은 여과장치를 상실한 채 민생팔이 선동가들의 놀이터, 헌법 파괴 포크레인으로 변질했다. 헌법은 허점이 많은 최소한의 계약이다. 헌법 ‘내’에서 계엄령을 했다고 강변하고, 헌법 ‘내’에서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면, 갈팡질팡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격투하는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짓밟았다고 할 수밖에.
상호비방으로 시작해 내란죄 공세로 끝나는 2024년 성탄절 이브의 종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시민들을 오랫동안 괴롭힌 사화(士禍)적 적개심이 결국 민주주의의 장송곡을 틀고 말았다. 장례식을 치르면 새 생명이 태어날까.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 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